 |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과를 보며 중력의 법칙을 연구하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19개의 다른
사과가 있었다. 심지어 이 사과 중 15개는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조차 따르지 않았다. 결국 뉴턴, 아인슈타인이 보고 설명
한 것은 우주의 5%밖에 안 됐다. 이것이 지금까지 연구된 현대우주론의 설명이다.
현대우주론은 '빅뱅 이론'부터 시작한다. 빅뱅은 상상할 수도 없이 높은 밀도를 갖는 아주 작은 점이 거대 폭발을 하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27년 벨기에 천문학자 조지 르메트르가 '원시 원자에 대한 가설'에서 처음 제안했다.
당시 우주는 항상 물질을 생성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정상우주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르메트르의 논문은
어불성설로 치부됐다. 심지어 정상우주론을 주장하던 영국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BBC 라디오에 출연해 르메트르의
논문을 비꼬면서 '빅뱅'이라 불렀다. 이를 계기로 르메트르의 이론은 '빅뱅'이란 명칭을 갖게 된다.
하지만 1929년 1월 17일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두 별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빅뱅 이론은 강력한 설득력을 얻는다.
이후 1965년 아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태초 우주의 등방성을 증명해주는 우주배경복사(2.7K)를 발견하면서 빅뱅
이론은 현대 표준우주론으로 완전히 정착했다.
단 빅뱅 이론으로 시작한 우주팽창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1981년대 빅뱅 이후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우주가 확장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해 문제를 해결
하려 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앞으로 감속 팽창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도달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천체물리학자 사울 펄무터,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가 201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우주가속
팽창이론'은 기존에 있던 우주에 대한 인식을 모두 뒤바꿔버린다. 이들은 'SN1a' 유형의 초신성을 관측해 거리를 알아
가면서 우주가 가속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실제로 관측된 우주의 가속팽창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 우주가 가속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이다. 그러나 중력에 반하며 가속팽창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척력의 작용을 설명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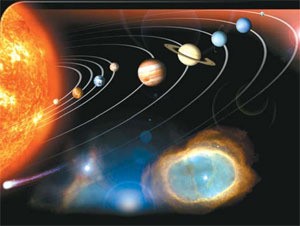 |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가속팽창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도입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암흑에너지'다.
현재 이론적인 계산에 따르면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 볼 수 없는 물질이 95%를 차지하고 볼 수 없는
물질 중 70%가 암흑에너지다. 현재까지 암흑에너지를 도입해 우주의 가속팽창을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흔히 우주 가속팽창의 발견을 암흑에너지의 발견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암흑에너지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지금도 세계의 물리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가속팽창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시도한다.
그중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수정해 우주의 중력모형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증명한 범위는 태양계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태양계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으로 상대성이론의 중력
모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론은 우주 표준 모형이 기반하고 있는 우주 균일성의 가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초기 우주가 균일하다는
가정이 현재 우주 표준 모형과 맞으면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가속팽창을 하는 우주에 다른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송용선 한국천문연구원 물리학 박사는 "뉴턴 중력에서 아인슈타인의 중력설로 이동하기 전 설명하지 못했던 물리적 현상
에 대해서 암흑행성을 도입했듯이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암흑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아인슈타인과 같이 새로운 중력론을 설명해주는 과학자가 나온다면 또 한 번 우주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