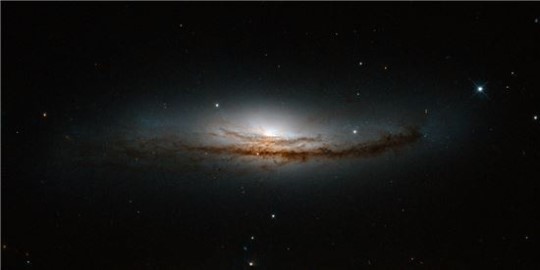[서울신문 나우뉴스]바다 속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를 연상시키는 말미잘, 그런데 최근
이 말미잘이 반은 ‘식물’, 반은 ‘동물’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연구진이 말미잘의 유전자 일부가 식물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말미잘의 87개 ‘마이크로 RNA’(동·식물 세포에 들어 있는 물질로 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과하거나 부족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 마이크로RN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뇨, 암 등의 질병을 앓을 수 있다)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구조가 식물 RNA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HYL-1이라는 명칭의 마이크로 RNA가 말미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RNA는 오직 식물에서
만 관찰되어 왔고 동물에서는 추출된 적이 없기에 이번 발견이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
기존 연구에서 말미잘의 유전자는 인간, 초파리 등과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식물성 RNA까지 발견되
면서 말미잘은 동물과 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생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자포
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강장동물 ‘말미잘’은 일반적으로 산호류로 분류되지만 군체를 이루지 않고 단독생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를 종합해보면, 태초의 마이크로 RNA는 동물과 식물의 공통 조상이었지만 이후 진화단계를 거치며
동물성 RNA와 식물성 RNA로 분리돼 현재에 이르렀고 유일하게 말미잘만 두 가지 특성을 아직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말미잘의 RNA 구조는 지구 생명체의 진화단계를 다양하게 추정해볼 수 있는 특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유전 연구 저널’(journal Genome Research)에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됐다.